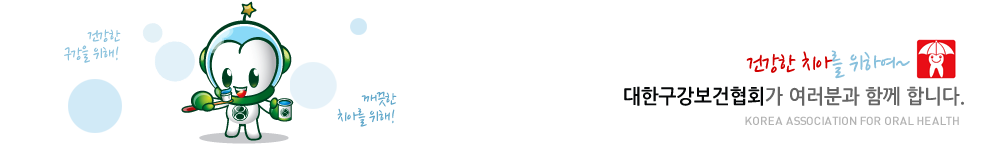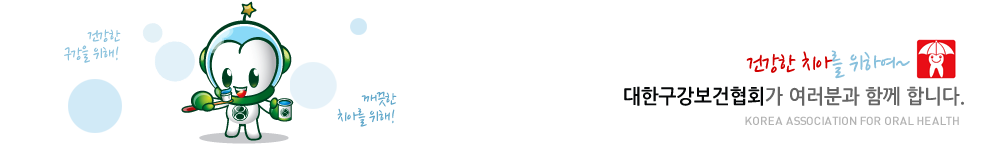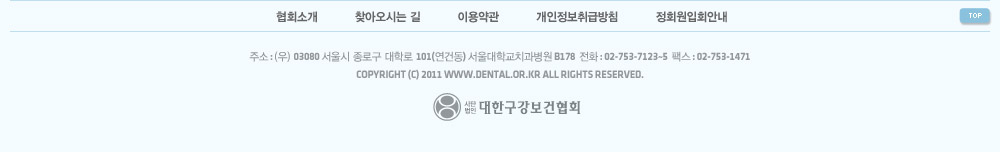치아와 악안면구강조직기관의 구조와 기능
먼저 치아의 구조와 기능을 기술하고, 악안면의 구조와 기능을 기술한 다음에, 혀의 구조와 기능을 기술하고, 구강의 구조와 기능을 기술한 다음, 타액선의 구조와 기능을 기술합니다.
1. 치아의 구조와 기능
치아(齒牙)란 구강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식물(食物)을 저작하고 발음(發音)을 조작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치아의 대부분은 그림 1과 같이 상아질(象牙質)이라고 하는 단단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아질의 중심부에는 치수(齒髓)라고 하는 연조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수를 이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구강에 노출되는 부위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법랑질(琺瑯質)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덮여 있습니다. 상아질과 치수 및 법랑질이라는 세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이 치아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치아는 구강조직기관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상악골과 하악골의 치조궁에 식립되어 있습니다. 상악골과 하악골 가운데에서 각각 치아가 식립되어 있는 부분을 특히 치조궁(齒槽弓)이라고 하며, 치조골(齒槽骨)이라고도 합니다. 치아를 치조골에 결합하는 섬유조직을 치주인대(齒周靭帶) 또는 치근막(齒根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주인대와 치아를 결합시키는 조직을 백악질(白堊質)이라고 하며, 치조골을 덮고 있는 연조직을 치은(齒齦)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치조골과 치근막과 백악질 및 치은의 네 가지 조직을 묶어서 치아주위조직(齒牙周圍組織)이라고 합니다. 한편, 치아 가운데에서 그림 1과 같이 구강에 노출되는 부분을 치관(齒冠)이라고 하며, 치조골에 묻혀 있는 부분을 치근(齒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관과 치근의 경계부위를 치경부(齒頸部)라고 하며, 이러한 치경부에서 법랑질과 백악질이 접합합니다.
치아는 유치와 영구치로 구분됩니다. 유치(乳齒)란 젖을 먹는 시기에 사용하는 치아로서, 그림 2와 같이 상악골과 하악골에 각각 10개씩 식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일생 동안 20개의 유치를 사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출생 후 7월부터 24개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맹출하였다가, 대략 6세부터 11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탈락됩니다. 그리고, 영구치(永久齒)란 유치가 탈락된 부위와 유치열의 후방에 맹출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치아로서, 그림 3과 같이 상악골과 하악골에 각각 16개씩 맹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일생 동안 32개의 영구치를 사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영구치는 대략 6세부터 14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맹출합니다. 그러나, 유치가 탈락된 부위에는 대략 6세부터 11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영구치가 맹출하는 까닭에, 6세부터 11세까지의 기간을 통상 치아교환기(齒牙交換期)라고 하며, 초등학교 학령기와 일치합니다.
치아의 배열 가운데에서, 유치의 배열을 유치열(乳齒列)이라 하고, 영구치의 배열을 영구치열(永久齒列)이라고 하며, 유치와 영구치가 혼합된 배열을 혼합치열(混合齒列)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6세 미만의 어린이의 치열은 유치열이고, 12세 이상인 사람의 치열은 영구치열이며, 초등학교 아동의 치열은 혼합치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악치아의 배열을 상악치열(上顎齒列)이라고 하며, 하악치아의 배열을 하악치열(下顎齒列)이라고 합니다. 한편, 우측치아의 배열을 우측치열(右側齒列)이라고 하며, 좌측치아의 배열을 좌측치열(左側齒列)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악우측유치열(上顎右側乳齒列) 상악좌측유치열(上顎左側乳齒列) 하악좌측유치열(下顎左側乳齒列) 및 하악우측유치열(下顎右側乳齒列)에는 각각 다섯 개씩의 유치가 배열되어 있고, 상악우측영구치열(上顎右側永久齒列) 상악좌측영구치열(上顎左側永久齒列) 하악좌측영구치열(下顎左側永久齒列) 및 하악우측영구치열(下顎右側永久齒列)에는 각각 여덟 개씩의 영구치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치아 가운데에서 그림 2와 3과 같이 구강의 앞쪽에 배열된 치아를 전치(前齒)라고 하며, 뒤쪽에 배열된 치아를 절구와 비슷한 치아라는 뜻으로 구치(臼齒)라고 합니다. 전치는 상악과 하악의 좌우측에 각각 세 개씩 배열되어 있고, 이들 가운데에서 제일 앞쪽의 전치를 중절치(中切齒)라고 하며, 두 번째의 전치를 측절치(側切齒)라 하고, 세 번째의 전치를 견치(犬齒)라고 합니다. 유구치(乳臼齒)는 상악과 하악의 좌우측에 각각 두 개씩 배열되어 있고, 이들 가운데에서 앞쪽의 유구치를 제1유구치(第一乳臼齒)라고 하며, 뒤쪽의 유구치를 제2유구치(第二乳臼齒)라고 합니다. 영구구치(永久臼齒)는 상악과 하악의 좌우측에 각각 다섯 개씩 배열되어 있고, 이들 가운데에서 앞쪽의 두개를 작은 절구와 비슷한 치아라는 뜻으로 소구치(小臼齒)라고 하며, 뒤쪽의 세 개를 큰 절구와 비슷한 치아라는 뜻으로 대구치(大臼齒)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씩의 소구치(小臼齒) 가운데에서 앞쪽의 소구치를 제1소구치(第一小臼齒)라고 하며, 뒤쪽의 소구치를 제2소구치(第二小臼齒)라 하고, 세 개씩의 대구치(大臼齒) 가운데에서 앞쪽의 대구치를 제1대구치(第一大臼齒)라고 하며, 가운데의 대구치를 제2대구치(第二大臼齒)라 하고, 뒤쪽의 대구치를 제3대구치(第三大臼齒) 또는 지치(智齒) 혹은 사랑니라고 합니다. 제3대구치를 지치라고도 하고, 사랑니라고 지칭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
두 자 리 숫 자 치 아 지 칭 법 |
|
|
|
|
|
|
55 |
54 |
53 |
52 |
51 |
61 |
62 |
63 |
64 |
65 |
|
|
|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48 |
47 |
46 |
45 |
44 |
43 |
42 |
41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
|
|
|
85 |
84 |
83 |
82 |
81 |
71 |
72 |
73 |
74 |
75 |
|
|
|
이러한 52개의 치아를, 위와 같이, 두 자리 숫자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상하 좌우의 영구치열(永久齒列)을 구성하는 여덟 개씩의 영구치아를 각각 정중선으로부터 배열된 순서에 따라 1번부터 8번까지의 첫째자리 숫자로 지칭하고, 상하 좌우의 유치열(乳齒列)을 구성하는 다섯 개씩의 유치를 각각 정중선으로부터 배열된 순서에 따라 1번부터 5번까지의 첫째자리 숫자로 지칭하며, 치아검사순서(齒牙檢査順序)에 따라 상악우측영구치열을 10대 숫자로, 상악좌측영구치열을 20대 숫자로, 하악좌측영구치열을 30대 숫자로, 하악우측영구치열을 40대 숫자로, 상악우측유치열을 50대 숫자로, 상악좌측유치열을 60대 숫자로, 하악좌측유치열을 70대 숫자로, 하악우측유치열을 80대 숫자로, 각각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상악우측제3대구치를 18번이라고 지칭하고, 상악좌측제2대구치를 27번이라고 지칭하며, 하악좌측제2유구치를 75번이라고 지칭하고, 하악우측유견치를 83번이라고 지칭합니다.
치아는 섭식기능과 저작기능 이외에도, 발음기능과 미용기능 공격기능 및 방어기능도 발휘합니다. 그러나, 저작기능과 발음기능 및 미용기능을 치아의 세 가지 기본기능(基本機能)이라고 합니다.
2. 구강의 구조와 기능
구강(口腔)이란 신체 밖으로부터 음식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서, 소화기관계(消化器官係)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러한 구강의 상벽은 그림 4와 같이 경구개(硬口蓋)와 연구개(軟口蓋)로 구성되고, 하벽은 하악골(下顎骨)과 혀 및 설하조직(舌下組織)으로 이루어지며, 전벽은 가동성 입술이고, 좌우의 벽은 협부조직(頰部組織)이며, 앞쪽은 구열(口裂)로 외계와 교통하고, 뒤쪽은 인협(咽峽)으로 인두와 교통합니다.
입술은 윗입술과 아랫입술로 구분되고, 연구개의 뒤쪽 중앙에는 인두로 향하여 늘어지는 구개수(口蓋垂)가 있습니다. 그 양측의 외벽에는 각각 구개설궁(口蓋舌弓)과 구개인두궁(口蓋咽頭弓)이라고 하는 두 개씩의 추벽이 있으며, 두 개의 추벽 사이에는 구개편도선(口蓋扁桃腺)이 있습니다. 양쪽의 추벽인 구개설궁(口蓋舌弓)이 구강의 후방경계입니다. 그러나, 치조궁(齒槽弓)과 치열궁(齒列弓)에 의하여 구강은 앞쪽의 구강전정(口腔前庭)과 안쪽의 고유구강(固有口腔)으로 구분됩니다. 고유구강의 아래쪽 중앙에는 근육으로 구성된 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강은 섭식기능 저작기능 소화기능 미각기능 이외에도, 발음기능 표정기능 미용기능 방어기능 및 공격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제반 기능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구강에서는 타액이 끊임없이 분비됩니다.
3. 혀의 구조와 기능
혀는 구강의 바닥에 있는 근육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설(舌)이라고도 하고,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혀와 관계되는 근육은 설골 하악골 측두골의 경상돌기 및 인두 등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혀의 앞쪽 유리단을 설첨(舌尖)이라고 하며, 혀의 상면과 하면의 경계부위를 설연(舌緣)이라고 합니다. 혀의 윗면을 설배(舌背)라고 하는데, 설배의 전부는 구강에 있으나, 후부는 인두부에 있습니다. 혀 가운데에서 설배가 구강에 있는 부분을 설체(舌體)라고 하며, 인두부에 있는 부분을 설근(舌根)이라고 합니다. 혀의 하면 전외측은 유리되어 점막으로 덮여 있고, 하부는 얇고 평활한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하면 정중선에는 설소대(舌小帶)라고 하는 점막의 주름이 있습니다. 혀에는 점액선(黏液腺) 장액선(漿液腺) 및 혼합선(混合腺)이라고 하는 세 가지 타액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혀는 저작기능 미각기능 연하기능 발음기능 등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4. 악안면의 구조와 기능
문자의 뜻으로는 악안면이란 턱과 안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치학계에서 악안면(顎顔面)이란 상악골과 하악골 및 상하 악골을 덮고 있는 안면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악골(上顎骨)이란 상악치아가 식립되어 있는 골입니다. 그림 5와 같이 상악골은 안면두개의 중앙에 위치하여, 안면의 중심부를 구성합니다. 위턱뼈라고도 하며, 안와의 하벽과 비강의 하외벽 및 구강의 상벽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상악골은 상악체와 여기에서 나오는 전두돌기 협골돌기 치조돌기 구개돌기로 구분됩니다. 상악체(上顎體)란 상악골의 중앙부분으로서, 그 속에는 상악체의 외형과 일치하는 상악동(上顎洞)이라는 공동이 있습니다. 전두돌기(前頭突起)는 상악체의 상방으로 나와 있는 돌기이고, 협골돌기(頰骨突起)는 전외방으로 돌출하여 협골과 결합하는 삼각형의 돌기입니다. 치조돌기(齒槽突起)는 하방으로 돌출한 활모양의 돌기로서, 치조궁(齒槽弓)이라고도 하며, 여기에 상악치아가 식립되어 있습니다. 구개돌기(口蓋突起)는 상악체의 하면에서 내방으로 나오는 골판으로서, 양측의 구개돌기가 결합하여 구강과 비강을 구분하는 경구개(硬口蓋)를 형성합니다. 하악골(下顎骨)이란 하악 치아가 식립되어 있는 뼈를 말합니다. 그림 5와 같이 두개골 가운데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여, 안면의 하부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유일한 골입니다. 밑턱뼈 또는 아래턱뼈라고도 하며, 구강의 전하외벽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하악골은 하악체와 하악지로 구분됩니다. 하악체(下顎體)란 수평인 부분을 말하고, 하악체의 상부에 하악치아가 식립되어 있는 부분을 특히 치조부(齒槽部)라고 하며, 치조궁(齒槽弓)이라고도 합니다. 하악지(下顎枝)는 하악체의 양측 후단에서 후상방으로 돌출한 부분으로서, 측두골의 하악와와 관절하여 악관절(顎關節)을 이룹니다. 이러한 하악지의 상연에는 앞뒤 두 개의 돌기가 있는데, 전방의 돌기를 오탁돌기(烏啄突起)라고 하며, 후방의 돌기를 관절돌기(關節突起)라고 합니다. 이 관절돌기의 상단을 특히 하악두(下顎頭)라고 하며, 오탁돌기와 관절돌기 사이의 절흔을 하악절흔(下顎節痕)이라고 합니다.
상하 악골을 덮고 있는 안면조직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조직은 구순과 협 및 악하부조직으로 구분됩니다. 구순(口脣)이란 구강의 가동성 입구조직으로서, 상순과 하순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상하의 구순이 서로 연결되는 우각부를 구각(口角)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순은 구륜근 결합조직 구순선 혈관 신경 점막 및 피부로 구성되어 있고, 피부가 덮여 있는 외면을 피부부(皮膚部)라고 하는 반면에, 점막으로 덮여 있는 내면을 점막부(粘膜部)라고 합니다. 성인 남자의 피부부에는 수모(鬚毛)라고도 하는 수염이 나며, 상순의 정중선에는 비중격에서 내려오는 얕은 고랑이 있는데, 이를 인중(人中)이라고 합니다. 상순의 내측 점막은 상악골 치조돌기의 외면에서 반전하고, 하순의 내측점막은 하악골 치조부의 외면에서 반전하여, 치은과 연결되고, 원개(圓蓋)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원개의 정중선에는 주름이 생기는데, 이 주름을 순소대(脣小帶)라고 합니다. 구륜근에는 안면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협(頰)이란 뺨이라고도 하는 구강전정의 외벽을 이루는 가동성 안면조직으로서, 경계가 불명료합니다. 그러나, 전내방으로는 구순에 연속되고, 상방으로는 협골궁으로, 후방으로는 이개로, 하방으로는 하악골의 하연으로 경계됩니다. 내면의 점막과 외면의 피부 사이에는 근육 결합조직 혈관 신경 지방 등이 있습니다. 특히 뺨에는 지방이 많아서, 포동포동하고, 소근이 있어서, 젊은 여인이 웃을 때에는 외면에 소압(笑壓)이라고도 하는 보조개가 생기기도 합니다. 협점막의 상악 제2대구치 협면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이하선으로부터 타액을 운반하는 이하선관(耳下腺管)의 개구부가 있는데, 이를 이하선유두(耳下腺乳頭)라고 합니다. 악하부조직(顎下部組織)이란 하악골의 하연과 양측 흉쇄유돌근의 전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악골의 하방에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악하부조직은 피부로 덮여 있고, 여러 가지 근육과 신경 혈관 임파절 결합조직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경부내장이 들어 있습니다. 경부내장(頸部內藏)으로서는 소화관의 상부인 인두와 식도가 있고, 호흡기도의 상부인 후두와 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갑상선과 부갑상선도 있고, 주요한 혈관으로는 총경동맥과 대경정맥이 있으며, 주요한 신경으로는 미주신경이 있습니다.
5. 타액선의 구조와 기능
타액(唾液)이란 구강에 존재하는 액체입니다. 그러므로, 타액을 구강액체(口腔液體)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액을 침이라고 합니다. 타액의 대부분은 타액선에서 분비되나, 치은열구에서 분비되는 삼출액이 혼합되기도 하며, 탈락상피가 혼합되기도 합니다. 타액은 구강조직이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구강질병의 발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타액의 분비율과 점조도 및 완충능은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 및 점막질병의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단백질 당질 지질 무기질 같은 타액성분 역시 구강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타액을 분비하는 샘을 타액선(唾液腺) 또는 침샘이라고 하며, 이하선(耳下腺)과 악하선(顎下腺) 및 설하선(舌下腺)이 대표적인 삼대타액선입니다.
이하선(耳下腺)은 양측 귀의 전하방에 있습니다. 이하선에서 구강으로 타액을 운반하는 이하선관의 길이는 약 7cm정도이고, 상악 양측 제2대구치와 서로 닿는 협점막에 개구합니다. 악하선(顎下腺)은 양측 악하부조직의 속에 있고, 호두모양입니다. 악하선에서 구강으로 타액을 운반하는 악하선관의 길이는 약 5cm 정도이고, 설소대의 양측에 있는 설하소구에 개구합니다. 설하선(舌下腺)은 구강저의 설하주름 바로 밑에 있으며, 다수의 작은 설하선관이 주름에 개구합니다.
[이 게시물은 KDHA님에 의해 2019-03-28 15:50:35 구강보건교육자료에서 이동 됨]